[Ⓒ 챗GPT 생성][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] ‘소버린 AI’. 요즘 국내 IT 업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단어다. 인공지능(AI)에 대한 통제권과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, 특히 공공분야와 규제산업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.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용어의 정의를 놓고, 소위 ‘진짜’ 소버린 AI와 ‘가짜’ 소버린 AI를 가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.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는 최근 열린 자사 기자간담회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. 그는 이 자리에서 “외산 기술을 들여와 우리 것이라고 상표만 붙인 것을 소버린 AI라고 하는 건 언어도단”이라며 ‘가짜 소버린 AI’를 일갈했다. 이는 KT가 마이크로소프트(MS)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개발한 소버린 AI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컸다.김 대표는 소버린 AI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. ▲정부와 기업의 자주적 의지 ▲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▲기술 제공자들과의 협조다. 그러니 단순히 외산 기술을 조립해 쓰는 방식으로는 ‘소버린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. 네이버클라우드 역시 AI 공급망 측면에서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있지만, 핵심 기술의 ‘내재화’ 없이는 결코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.반면 KT의 기준은 다르다. KT는 얼마 전 자사 AI 및 클라우드 전략 발표에서 소버린 클라우드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원칙으로 ▲국내 데이터 상주 ▲국내 법규 준수 ▲데이터 전 생애주기 보호 ▲고객 자원 소유권 강화를 내세웠다.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KT는 곧 출시할 소버린 클라우드 서비스를 MS 애저 한국 리전 기반으로 구성하고, 소버린 랜딩존 정책을 통해 산업별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.KT의 관점에서 ‘소버린’이란, 기술의 출처보다도 그 기술이 국내 법제도에 따라 통제되고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방점이 찍힌다. 해외 기술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데이터가 국내에 머물고, 외부 비인가자나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(CSP) 운영자도 접근할 수 없으며, 사용 중 데이터까지 암호화할 수 있다면, 주권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는 논리다.이렇듯 네이버와 KT는 소버린 AI 혹은 소버린 클라우드의 정의를 다[Ⓒ 챗GPT 생성][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] ‘소버린 AI’. 요즘 국내 IT 업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단어다. 인공지능(AI)에 대한 통제권과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, 특히 공공분야와 규제산업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.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용어의 정의를 놓고, 소위 ‘진짜’ 소버린 AI와 ‘가짜’ 소버린 AI를 가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.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는 최근 열린 자사 기자간담회에서 이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. 그는 이 자리에서 “외산 기술을 들여와 우리 것이라고 상표만 붙인 것을 소버린 AI라고 하는 건 언어도단”이라며 ‘가짜 소버린 AI’를 일갈했다. 이는 KT가 마이크로소프트(MS)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개발한 소버린 AI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컸다.김 대표는 소버린 AI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다. ▲정부와 기업의 자주적 의지 ▲글로벌 밸류체인 참여 ▲기술 제공자들과의 협조다. 그러니 단순히 외산 기술을 조립해 쓰는 방식으로는 ‘소버린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. 네이버클라우드 역시 AI 공급망 측면에서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있지만, 핵심 기술의 ‘내재화’ 없이는 결코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.반면 KT의 기준은 다르다. KT는 얼마 전 자사 AI 및 클라우드 전략 발표에서 소버린 클라우드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원칙으로 ▲국내 데이터 상주 ▲국내 법규 준수 ▲데이터 전 생애주기 보호 ▲고객 자원 소유권 강화를 내세웠다.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KT는 곧 출시할 소버린 클라우드 서비스를 MS 애저 한국 리전 기반으로 구성하고, 소버린 랜딩존 정책을 통해 산업별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.KT의 관점에서 ‘소버린’이란, 기술의 출처보다도 그 기술이 국내 법제도에 따라 통제되고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방점이 찍힌다. 해외 기술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데이터가 국내에 머물고, 외부 비인가자나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(CSP) 운영자도 접근할 수 없으며, 사용 중 데이터까지 암호화할 수 있다면, 주권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는 논리다.이렇듯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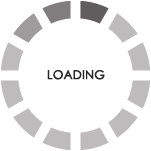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